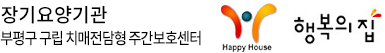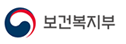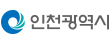“치매라도 끝이 아니다”…‘초고령’ 일본 치매 정책 보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8-26 14:45본문
■ '초고령 사회' 먼저 진입한 일본 치매 정책 보니
2006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노인 인구가 늘어난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치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시기도 빨랐습니다.
일본의 치매 환자 수는 1990년대 100만 명을 돌파해, 올해 47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내년에 치매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이 쌓아 온 치매 대책은 분명 참고할 만합니다.
■ "치매 환자도 '할 수 있다' 믿어줘야…고립되면 우울증 위험"
최근 시민단체 '다른몸들' 주최로 치매를 앓는 일본인 활동가들이 방한해 치매 보호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2년 전 대형 자동차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알츠하이머 형 인지저하증을 진단받은 51살 탄노 도모후미 씨. 이 자리에서 치매 환자도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탄노 도모후미 씨는 병을 앓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업무만 영업에서 치매 인식 개선 활동으로 바뀌었을 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치매가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며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홀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환경이 가장 큰 약…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편견"
6년 전 초로기 알츠하이머형 인지증 진단을 받은 48살 야마나카 씨도 치매 환자의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마나카 씨는 치매 진단 이후에도 싱글맘으로 3남매를 키워내는 등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일본 치매 기본법 "치매 환자도 사회 일원…포용 사회 목표"
상대적으로 긴 기간 '치매'와 마주해 온 일본 정부는 두 활동가의 조언을 실제 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은 치매 기본법을 제정해 치매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은 치매를 의료·복지의 과제로 한정하지 않고, 치매 환자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의 인권과 자립, 사회참여,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 가치로 삼고 국가·지자체·국민·서비스 제공자 등 모든 주체에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근거한 '치매 시책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치매를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치매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포용해야 할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가정에만 미뤘던 우리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한 게 불과 4년 전입니다.
이후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돌봄 인프라는 강화됐지만, 치매 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돌봄 문제에 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는 "질병이 있어도 질병권이 보장되는 사회, 즉 잘 아플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절망 속에만 살지 않을 수 있다"며 "인지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통제가 아닌 실수해도 괜찮은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노인 인구가 늘어난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치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시기도 빨랐습니다.
일본의 치매 환자 수는 1990년대 100만 명을 돌파해, 올해 47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내년에 치매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이 쌓아 온 치매 대책은 분명 참고할 만합니다.
■ "치매 환자도 '할 수 있다' 믿어줘야…고립되면 우울증 위험"
최근 시민단체 '다른몸들' 주최로 치매를 앓는 일본인 활동가들이 방한해 치매 보호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2년 전 대형 자동차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알츠하이머 형 인지저하증을 진단받은 51살 탄노 도모후미 씨. 이 자리에서 치매 환자도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탄노 도모후미 씨는 병을 앓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업무만 영업에서 치매 인식 개선 활동으로 바뀌었을 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치매가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며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홀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환경이 가장 큰 약…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편견"
6년 전 초로기 알츠하이머형 인지증 진단을 받은 48살 야마나카 씨도 치매 환자의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마나카 씨는 치매 진단 이후에도 싱글맘으로 3남매를 키워내는 등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일본 치매 기본법 "치매 환자도 사회 일원…포용 사회 목표"
상대적으로 긴 기간 '치매'와 마주해 온 일본 정부는 두 활동가의 조언을 실제 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은 치매 기본법을 제정해 치매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은 치매를 의료·복지의 과제로 한정하지 않고, 치매 환자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의 인권과 자립, 사회참여,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 가치로 삼고 국가·지자체·국민·서비스 제공자 등 모든 주체에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근거한 '치매 시책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치매를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치매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포용해야 할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가정에만 미뤘던 우리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한 게 불과 4년 전입니다.
이후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돌봄 인프라는 강화됐지만, 치매 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돌봄 문제에 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는 "질병이 있어도 질병권이 보장되는 사회, 즉 잘 아플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절망 속에만 살지 않을 수 있다"며 "인지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통제가 아닌 실수해도 괜찮은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